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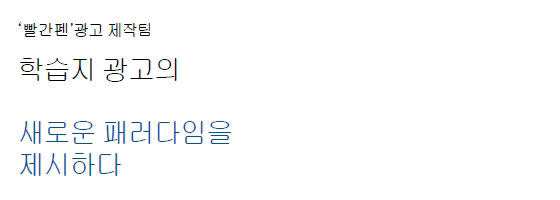

분신술이라도 펼치듯, 몸이 10개로 나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엄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숨 가쁜 일상이, 15초 광고 속에서 빠른 리듬으로 진행된다.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내되 경쾌한 터치로 재미를 준 빨간펜 광고는 CM송이 압권이다. 귀에 감기는 멜로디를 타고 또박또박 귓전을 울리는 노랫말이, 엄마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학습지 광고시장의 오랜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깃층의 공감을 이끌어낸 ‘빨간펜’ 광고 제작팀을 만났다.
글 ㅣ 편집부
광고의 컨셉트는 무엇인가?
김재철 팀장 ː ‘교과서 진도대로, 학교 공부엔 빨간펜’을 골자로 한다. 광고에 흐르는 CM송처럼 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몹시 바쁘다. 아이 독서 지도부터 급식 당번, 어머니회, 참관 수업 등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엄마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아이 학교 공부만큼은 빨간펜이 확실히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엄마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아이 학교 공부만큼은 빨간펜이 확실히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다른 학습지 광고와의 차별화 요소는?
배유선 대리 ː 재미있는 CM송을 통해 아이보다 엄마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보통 학습지 광고의 대부분이 아이를 중심으로 학교 책상, 집 책상을 조명한다. 하지만 빨간펜은 엄마들의 입장에서 에피소드를 이어가고, 결국 빨간펜이 바쁜 엄마들을 도와준다는 설정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광고 ‘엄마의 잔소리’ 편에 이어 이번에도 오페라 느낌의 CM송이 돋보인다.
김재철 팀장 ː 작년 광고에서 선보인 박미선 씨의 ‘잔소리 송’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재미는 물론 엄마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광고주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렇게 반응이 좋다 보니 모델도, 오페라 느낌의 CM송도 한 번 더 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같은 맥락으로 가더라도 전편보다 더 재미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부담도 컸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박미선 씨의 활약이 인상적이다.
양선일 부장 ː 사실 학습지 광고모델로는 의외의 인물인 셈이다. 박미선 씨의 경우, 개그맨보다는 방송 진행자로서의 역량이 더 부각되긴 하지만, 지적 이미지의 모델을 선호하는 학습지 광고 시장에선 개그맨을 모델로 기용하는 사례가 드물다. 가령, 학습지 광고는 어린이 모델을 기용할 때도 인지도 높은 아이보다 인지도가 낮더라도 이른바 ‘공부 잘하게 생긴’ 똘똘한 이미지의 모델을 선호한다.
배유선 대리 ː 박미선 씨가 모델로 발탁된 이유는 그녀 특유의 진솔하고 선한 이미지,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은 느낌과 <세바퀴>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의 타깃층인 주부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광고주에게 부각된 것 같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김재철 팀장 ː 아무래도 CM송을 만드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 일단, 경쾌한 느낌에 대중의 귀에 익은 멜로디여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곡이 주페의 ‘경기병 서곡’이었고, 멜로디에 글자 수를 맞춰 메시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노랫말을 지었다. 가사가 곧 카피가 되는 경우였기에, 카피라이터를 기용했지만 제작팀 전원이 노랫말 작업에 매달렸다.
조서림 대리 ː 휴대폰에 멜로디를 다운 받아 계속 흥얼거리며 가사를 썼다. 오페라 가수가 부르는 노래야 듣기 좋겠지만,
 일반인이 부르니 듣기에 좀 거북했을 거다. 주변의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반복적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작업했다. 고생은 좀 했지만 재미있었다.
일반인이 부르니 듣기에 좀 거북했을 거다. 주변의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반복적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작업했다. 고생은 좀 했지만 재미있었다.양선일 부장 ː 15초는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담아야 할 게 많았다. 에피소드별 세트도, 신도, 가사도. 그걸 다 담아내되 눈에 띄게, 귀에 쏙쏙 박히게 우리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
노래는 박미선 씨가 직접 불렀나?
홍승찬 사원 ː 오페라 가수가 불렀다. 목소리 톤이 박미선 씨와 비슷해서 직접 부른 줄 아는 이들도 꽤 있다. CM송은 보통 촬영 후에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미리 녹음 작업을 끝내고 촬영장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립을 맞췄다. 자연스러운 립싱크의 비결이다.
촬영 당시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서림 대리 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숨 가쁜 엄마의 일상을 묘사하기 위해 분신술처럼 박미선 씨의 몸이 여러 개로 나뉘는 장면들은, 한 컷 한 컷 찍어 현장에서 바로 합성했다. 예를 들어 밥을 푸는 신 하나도 정면, 옆면, 뒷면 등 각을 달리하며 컷을 하나하나 찍어야 했기에 촬영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 밤을 새우고도 남을 분량이라고 생각했는데, 박미선 씨가 워낙 순발력 있게 연기를 잘해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오다 보니 생각보다 일찍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정재훈 사원 ː 급식 당번, 교통 봉사 등 각각의 에피소드별로 세트가 많이 필요했다. 또 장면이 빨리 전환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도록 모든 소품을 크게 만들었다. 책이든, 책가방이든, 펜이든 촬영에 사용한 소품 대부분을 실제 크기보다 엄청 확대했다. 촬영 끝나고 세트며 소품 옮기는 데도 꽤나 품이 들었다.
후반 작업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양선일 부장 ː ‘장면이 많은데 이해가 잘될까, 빨리 흐르다 보니 노래가 제대로 들릴까’ 하는 걱정을 가장 많이 했다. 편집을 여러 번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 같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누구 한 명 잘 안 들린다 하면 다시 편집하고, 또다시 하길 거듭했다. 결국 나중에는 노랫말의 확실한 전달을 위해 자막을 넣었다.
광고가 완성된 후의 감회라면?
홍승찬 사원 ː 지하철 또는 공공장소에서 빨간펜 CF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가 제대로 들리는지, 그것부터 신경 쓰게 된다. 걱정하던 부분이 잘 해결되어 기쁘고, 노력한 만큼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 전작인 ‘엄마의 잔소리’ 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엄마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데 만족한다.
정재훈 사원 ː 개인적으로 빨간펜 광고는 입사 후 첫 경험이다.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광고제작 전 과정을 빨간펜을 통해 처음 접해봤다. 과정 자체가 재미있었고, 결과물도 잘 나와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광고다.
조서림 대리 ː 깔끔한 뒷맛이랄까. 일단 의도한 대로 광고가 잘 나왔다. 광고주의 만족도도 높고 소비자의 반응도 좋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기들의 리얼한 일상을 잘 잡아냈다고 반색했다. 기획부터 제작, 마무리까지, 전반적으로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일이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